재일교포 고고학자 이진희는 1982 년 한국에서 간행한 <광개토왕릉비문 탐구>에서 일본 명치왕의 육군 참모본부가 고구려 광개토왕(앞으로 영락태왕이라 함)의 릉비 비문을 변조한 경과를 상세하게 밝히고 논증하였다.
이진희에 의하면 1870 년대 초 일본명치왕 참모부는 본래 임무인 군사 작전 수립과 성공을 위해 조선.청국에 밀정을 보내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 중에서 참모부가 관여하고 실행한 대표적인 것이 영락태왕비문 쌍구가묵본 입수와 해석 및 비면 석회도포와 2,3 차 변조라 하며 상세하게 논증하였다.
즉 1880 년 고구려 영락태왕비가 청국 봉천성 흥경부 환인현에서 발견되었고 1884 년 일본 밀정 육군 중위 주내경신(사코오가께아키)가 비문을 쌍구탁본한 100 여 매를 입수.휴대하고 귀국하여 참모부에 제출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참모부 주도하에 6 년에 걸쳐 간신히 석문을 작성하고 해독하여 1889 년 정탁본처럼 꾸며 일본 사회에 발표하였는데 비 발견이나 일본 밀정이 쌍구가묵본을 입수한 것은 물론이고 공개한 1889 년까지도 이조선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주) 현재의 압록강 변에 있는 영락태왕비(광개토왕비)
일본 참모부는 영락태왕비문 일부를 변조하여 4 세기 중반에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군사 활동을 강조하려 하였고 그 변조한 문구를 기초로 임나일본부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려 했지만 이진희는 쌍구탁본한 비문의 글자에 의문이 있기때문에 이제라도 비문을 정밀하게 조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연하고 옳은 주장이라 본다.
문제는 이진희가 논문을 발표한 1960 년대 초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및 일본 3 국의 지리 인식이 이미 크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진희도 그 왜곡된 지리를 눈치채지 못하고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즉 1880 년 영락태왕비가 발견된 청국 환인현 위치와 이진희가 비문 재조사를 주장한 1960 년대 초 영락태왕비의 위치는 같은 곳이 아니다. 일본 참모부 하수인들인 흑판승미.금서룡 등이 환인현을 찾아가 조사한 것은 1919 년까지였을 뿐이고 그 후 현지 조사가 허락된 1935 년 가을이였다.
이 16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영락태왕비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 기간 중에는 만주국이 1932 년 건국되었고 1934 년에는 일본참모부가 1870 년대 초부터 조선과 청국 국경 지역 지리를 동쪽으로 확산.이동 수법으로 조작한 지리를 선전해온 습작지도 표시를 공식화한 만주국지도가 간행되었다. 만주국지도는 청국의 동북쪽 국경 지명을 동북쪽으로 크게 확산.재배치 표시한 뻥튀기 조작지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1934 년 이후의 영락태왕비 위치는 원래의 위치일 수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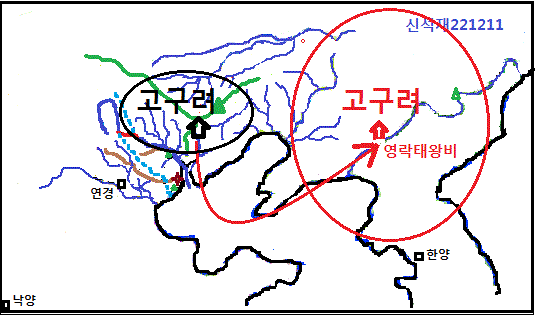
위와 같은 지리 조작이 가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기전 202 년 전한 시기부터 청국이 멸망한 1911 년까지의 중국의 모든 정사급 지리지에 기록.설명된 대요수.요하가 지금의 란하 중.하류 본.지류였기 때문이다. 즉 신채호.교시와 같이 `고대의 요하는 란하` `패수는 해성의 헌우락`이 중국 2000 여 년의 정확한 지리였고 비록 지류를 본류로 설명한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계연수의 `패수는 란하`라는 문장도 신채호의 문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아래 참조와 같이 참모본부 동과부 下村修介는 1875 년 복원화승 대좌가 청국 공사관부무관으로 부임할 때 수원으로 동행하여 각지를 스파이짓하고, 뒤에 참모본부 관서국에서 간행한 <지나지지> 총체부(1887), 만주부(1889)를 편집한 중심인물이라 하는데, 만주부에 표시된 지리는 당연히 당시의 청국 지리와 달랐고 연쇄적으로 이조선의 압록강도 지금의 란하 동쪽 지류인 지금의 청룡하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압록강을 표시한 것이다.
결국 대한제국 멸망 시기의 강역은 서북강역을 잃은 반쪽짜리 강역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이는 이조선을 영원히 식민지배하기 위하여 조선 역사 정통과 강역 모두 크게 축소시켜 조선인의 자조를 조장하여 독립 의지를 꺽으려한 기획 중의 하나인 것이다.
결국 영락태왕비 이전은 지리 조작의 후행적이며 부수적인 절차였을 뿐이였다.
[참조]
아래는 이진희도 영락태왕비 이전을 예측했을 만한 <광개토왕릉비문 탐구>의 본문 일부다.
1907 년 5 월에 小澤德平 大左가 비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현지에 뛰어 들었을 때 집안현지사 오광국이 `如愛此碑 僅可先送拓本數張(이 비를 좋아한다면 먼저 탁본 몇 장을 보낼 수 있을 따름이다)이라 답한 것도 탁본이 판매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본문 16 쪽)
그리고 노일전쟁이 끝나자 고대에 있어서 출병과 지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과시하기 위하여 비의 반출을 계획하고, 1907 년 5 월에는 小澤 육군 대좌가 현지에 뛰어든 것이다. 이때 해군은 압록강 하구까지 군함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본의 학자가 好太王碑를 알기 훨씬 이전부터 참모본부는 그것을 알고 비문을 연구했을 뿐 아니라 비 그 자체를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참모본부 편찬과에서는 酒匂가 비문을 갖고 돌아오기 전부터 고대의 한일관계사를 연구하여 1882 년에는 <任那考稿임나고고>가 쓰여졌다. 그것은 학자들이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의 일이다. (본문 17 쪽)
[비의 일본으로의 반출 계획]
일본의 구 참모본부는 광개토왕릉 비문에 손을 대었을 뿐 아니라 비 자체를 일본으로 운반하려고까지 했다.
...
동양사의 대가인 白鳥庫吉(학습원 교수, 뒤에 동경제대 교수)은 1905 년 8 월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물론 일본 역사에도 이 3 국이 일본에 조공했다든지, 혹은 속국이 되었다든지 하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일본 역사 등은 소위 전설이며 역사상의 가치가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 비문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신용할 역사상의 유물이다. 이에 의해서 일본이 조선 남부를 지배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재료를 제공한 것이다. 나는 이 비를 일본에 가지고 와서 박물관이나 공원이나에 세우는 것은 실로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당시 일본은 삼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이지만, 북부의 고구려와는 반대의 지위에 위치한 것이다. ...`
... 그는 1905 년부터 비의 운반을 열심히 주장했는데, 노일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06 년에는 그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해서 현지에 발을 내딛고 있다. ... 白鳥는 다른 글에서, `비를 갖고 돌아오는 일은 민정서의 승낙을 얻었을 뿐 아니라 나의 우인인 大原군도 마찬가지로 그 희망을 갖고 있었다`...
광개토왕릉비를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해 해군이 압록강 하구까지 군함을 돌려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연구자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 당사자의 한 사람이었던 押上森藏(1855~1927) 퇴역 중장은 1918 년 10 월 일본역사지리학회 예회 석상에서 그의 현역시대에 비를 운반할 계획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押上森藏은 비를 운반하지 못했던 이유를 `아무래도 컸으므로 운반이 곤란하였고 또한 자면이 손상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白鳥는, `한국 것을 갖고 돌아와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그 밖에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집안현향토지>(1915)에는 집안현지사인 오광국이 봉천제학사에게 보낸 1907 년 5 월 자의 주목할 문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의하면 오광국은 일본군 제 57 연대장인 小澤德平 대좌가 와서 비를 `일본박물원`(당시의 제실박물관, 현재 동경국립박물관)에 진열하고 싶으니 팔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 비는 민간의 것이며 더우기 비석은 묵직하므로 운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하자, 小澤은 병륜(군함)과 비교하면 석비의 무게는 아무 것도 아니다, 군함이 침몰한다 해도 끌어 올릴 수 있으므로 병력을 동원한다면 석비는 아주 쉽게 반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용의심심함을 살필수 있었다고 한다. ... 小澤德平(1855~1914)은 육군사관학교 제 2 기 졸업생으로, 1885 년 5 월에 참모본부에 들어간 이래 전후 18 년간 참모본부원으로서 청국 각지를 스파이짓하며 누빈 인물로, <회여록>이 출판된 1889 년 6 월에는 참모본부 제 2 국 부로 있었다. 광개토왕릉비의 발굴.운반을 어디서 계획하고, 누가 그것을 小澤에 명령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비와 관련을 갖는 군인이 모두 참모본부원을 지낸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 해답은 쉽사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1917 년에 竹內榮喜 중좌(뒤에 소장)가 `친히 현지를 방문하여 릉비 그 자체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竹內도 참모본부에서 근무한 것이 있는 인물로, `릉비 그 자체를 검토한 1917 년에는 `조선주차군사령부 부관`이었다. (본문 101,102,103,104,105쪽)
하지만 일본 학자로서 최초로 비를 본 것은 로일전쟁 직후인 1905 년 가을 鳥居龍藏(1870~1953)이었고, 그 이전에 현지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없다. 노일전쟁에 의해서 일본군이 점령이 시작되기까지는 일본인에게는 자유로운 만주 여행이 허가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스파이로서 구참모본부에서 파견된 경유는 별도이다. 그들은 현지어에 숙달할 때까지 훈련을 받은 뒤 중국인으로 변장하여 각지에 잠입했다. 처음으로 비문을 갖고 돌아온 酒匂景信은 북경에서 중국어를 습득하고 중국인 의사로 변장하여 성경성 일대를 누빈 참모본부 파견 장교였다. 5 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 비문을 해독.해석한 것도 참모본부 편찬과였으며, 酒匂와 교대하여 파견된 栗栖亮 중위도 비를 조사하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년 동 편찬과의 倉辻明俊 중위도 비를 조사하였다. (본문 16,17 쪽)
한편 <회여록>의 <고구려고비고>에는 `명치 21 년(1888) 10 월 橫井忠直 識`이라 되어 있어 양자가 쓰여진 시기도 같다. 이들 사실로부터 해독 작없의 실질적인 중심은 橫井忠直이며, 그의 1888 년 10 월 석문은 다른 해독자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佐伯有淸의 논문 <고구려광개토왕릉비문재검토를 위한 서장>(일본역사 제 287 호, 1972.4)에 의해서 횡정과 참모본부와의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좌백은 이 논문에서,
`이 인물은 1883 년 6 월의 <개정 관원록>에서 ``참모본부 과료 7 등출사 / 대분(역주:대분현 출신이란 뜻) / 橫井忠直``이라 보이고, 그 이듬해 육군대학교 교수를 겸임하였으며, 1885 년의 <개정 관원록>에서는 참모본부 편찬과 과료 겸 대학교수로서 기재되었고, 전게한 참모본부 편찬과 편 <정서전기고> 상권에는 1885 년 11 월 참모본부장 山縣有朋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 그 서문의 글자를 橫井忠直이 쓰고 있다. 橫井은 <정서전기고>를 편찬했을 것이다. 또한 1888 년 <고구려비출토기> 등을 집필했을 무렵에 해당하는 1888 년 12 월 1 일 현재의 <직원록> 육군참모본부 및 육군대학교 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편찬과 과원 대학교교관교수 橫井忠直...
육군대학교 교관 橫井忠直
이상의 좌백 연구에 의해서 橫井忠直은 1883 년 6 월에 참모본부에 출사하여 1885 년부터 동 편찬과 과료를 역임한 사실이 명백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독 작업의 정리가 행해진 해인 1888 년 9 월의 <개정 관원록>갑편을 보면 참모본부 육군부 제 2 국 항에는,
편찬과
과장 육군보병소좌 大原 里賢 ...
과원 대학교교관.육군교수 橫井 忠直 ...
동과附 육군성판임3등 下村 修介 ...
라 되어 있다. 편찬과장인 大原里賢은 1874 년부터 십수년간에 걸쳐서 청국 각지를 스파이짓하며 누비고 비 반출계획에도 관계한 인물로서 <영희본>을 수집하고 비문 해독 작업의 직접적인 지휘자였다. ... 또한 동과부에 보이는 下村修介는 1875 년 복원화승 대좌가 청국 공사관부무관으로 부임할 때 수원으로 동행하여 각지를 스파이짓하고, 뒤에 참모본부 관서국에서 편집한 <지나지지支那地誌> 총체부(1887 년 11 월 간행)와 동 편찬과 편집 <지나지지> 만주부(1889 년 10 월 간행)를 편집한 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하여 비문 해독 잡업의 중심 인물이었던 橫井忠直의 경력 및 그가 속했던 참모본부 편찬과의 동정의 일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광개토왕릉비문 해독 작업은 만 5 년 이상을 소비한 후 횡정이 다른 해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1888 년 10 월 석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한 판단에 잘못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발견한 井上賴圀 문서에 의해서 그러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았다. (본문 79,80 쪽)
[해독작업의 정리]
井上賴圀의 <옥록>에는 <회여록>과 같은 석문을 싣고, 그 뒤에 해독 작업의 정리가 1888 년 10 월에 酒구의 입회하에 행해진 것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정상의 첨서가 붙어있다.
`이 비는 靑江秀, 橫井忠直 두 사람의 주 및 도서료.박물관 등에 사본이 있긴 하나 착란이 있어 잘 통하지 않는다. 인하여 명치21년(1888) 10 월 11 일 궁내성에서 참모본부의 원본 및 통구에서 얻어 온 酒匂대좌에게 번호를 정정케 하였다(원비 글자의 깊이는 석면에서 3 촌쯤 되고, 결손이 심하므로 큰 종이에 탑본하기가 불가능하여 한 매에 16 자로 하여 번호를 붙인 것이다). 河田剛, 丸山作樂, 橫井忠直, 그리고 나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곳에서 이와 같은 훈점을 붙였다. 酒구景信은 북경에서 지나어를 배우고 만주 지방에 여행할 때 이 비를 얻었는데, 이 곳 인가는 20 호쯤 있었다 하며, 이에 이르기를 묘비상의 와瓦도 갖고 돌아와서 丸山作樂에 선사했는데 와는 거의 돌과 비길만한 견고한 것으로 가장자리에 문자가 있다(酒구대좌를 처음에는 佐川대좌라고 썻다가 뒤에 이를 酒匂로 정정하였다). (본문 81쪽)
丸山作樂(1840~1899)은 외무대승을 역임, 1871 년 `征韓`을 기도한 인물로 1887 년 경에는 제실제도취조괘로서 이등박문伊藤博文이나 井上毅의 자문에 응하였다. 한편 井上賴圀(1839~1914)은 그 당시 궁내성 도서료 주임어용괘였으며 뒤에 <고사유원>교열원, 학습원 교수를 역임한 거물이다.
참모본부 편차과에서의 해독 작업은 이상과 같은 경과를 거쳐 <회여록> 제 5 집으로서 1889 년 6 월에 출판되었다. 그간 일본의 대표적 漢學者가 해독에 참가하여 栗田寬, 飯田武鄕, 佐藤誠實 등의 국학자를 위시하여 일본 근대사학을 개척한 重野安繹. 久米邦武. 星野恆 등이 이를 교열했다. 그것은 일보 ㄴ학계를 동원한 해독 작업이었다고 해도 큰 잘못이 없을 정도로 대규모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해독 작업이 진행된 사실은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해독이나 교열을 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도 이에 대하여 공적으로 써서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참모본부로 부터 엄격한 함구령이 내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
해독 작업을 완료한 뒤 酒匂 쌍구본은 네 폭으로 표장되어 탁본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문자의 둘레나 순위 번호, 서로 연결한 부분을 짚은 먹으로 발랐다. 그리고 명치 21 년 (1888) 12 월 酒匂景信의 이름으로 명치천황에 헌상되어 1890 년 7 월에는 비의 존재를 널리 선전하기 위해 제국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본문 82,83쪽)
이처럼 일본의 대외 침략정책이 강화되어 가는 중에 참모본부는 1879 년 10 월 독일공사관 주재 무관으로서 군사행정을 배우고 돌아온 37 세의 桂太郞 중좌를 관서국장에 발탁하여, 그에게 대청 침략작전의 방안을 기초시키는 한편, 10 여 명의 장교를 비밀리에 청국에 보내어 군사적략적인 견지에서 병제.군비.지리를 조사 연구케 했다. 또한 이듬해인 1880 년에는 `지나어학생`의 명목으로 10 여 명을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안남.페르시아 방면에까지 참모본부 군인이 파견되었다. ... 참모본부 편찬과에서 편집한 <인방병비략>(1880)이나 <지나지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참모본부는 한국에도 군인을 보내어 <조선지지>를 편찬하는 등 대한.대청 침공작전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山縣有朋 참모본부장을 중심으로 군비의 대확장과 야전을 위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었다. (본문 90.91쪽)
2021 년 씀.
2024 년 고침.
'식민사관.동북공정 실체 > 일본조작.중국암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펌- 일인이 실토한 역사 조작 (4) | 2024.07.14 |
|---|---|
| 지금의 요동과 서요하.요하는 1932 년 일본이 이동.조작한 것 (1) | 2024.02.26 |
| 이조선과 청국 사이의 국경 지리를 뻥튀기.조작한 일본명치왕 (0) | 2023.11.27 |
| 식민.공정은 조작지도에 근거한 엉터리 주장 (0) | 2023.11.12 |
| 한국인이 신봉하는 일본명치왕놈이 만든 역사 동굴의 허상 (0) | 2023.09.27 |
